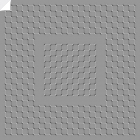|
|

사도신경 공부 ⑧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1~4
‘몸’처럼 서러운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요즘 같은 환절기면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지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주름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이래저래 힘겨운 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욥’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라 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한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부모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아이처럼 몸은 응석받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영혼만을 소중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몸 없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 몸이 문제인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없다면 죄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몸은 힘이 셉니다. 마음을 제멋대로 끌고 다닙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뿌리인 몸,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이면서 복입니다. 왜 그런가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 있는 몸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몸 때문에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오늘을 삽니다. 그런 몸속에는 우주의 신비가 숨어있습니다. 31억 개나 되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야심찬 게놈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과정을 이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의 암호를 해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위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의 신앙고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의 발전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오늘의 신앙고백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몸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망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령한 몸이라고 대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 미련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관련짓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몸, 가시 면류관에 찢기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그 몸은,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처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 몸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이 싹터서 나오는 거룩한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 없는 몸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일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로만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육신대로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게 해주는 부적입니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내어드리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것이며,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아 안아 온전케 하심을 믿는 것이며,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되었음을 믿으면서, 오늘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고백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성서학자 로흐만은 “기독교인도 죽음의 그늘에서 살지만 죽음을 믿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참으로 정확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픈 날,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함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운 누군가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힘들어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도구는 바로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몸’, 절망의 뿌리인 동시에 희망의 원천이기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괴롭고 힘겨워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 몸에 하늘을 품고 말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언젠가 후배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형은 죽음의 사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 수 있나, 함께 가야지.” “그렇게 느긋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난 저항할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 멀었다.’ 하면서 말이에요.” “글쎄, 시간을 연장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남겨둔 가족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이 더 어쩔 수 있겠어?” 지금도 이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삶을 한 방울씩 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이들을 바라보노라면 제 생각이 사치인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마치 뱀을 바라보듯이 이물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막상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흔적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는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비록 고단할망정 사람들은 산 자들의 땅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불멸을 꿈꿉니다. 물론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깁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는 없는 법, 보통 사람들은 죽음과 더불어 잊혀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짐을, 흐려짐을, 스러짐을 운명인양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땀 흘려왔던 날들과, 갈등과 아픔을 온몸으로 헤치고 나간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결국 산다는 게 이처럼 허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남기고 간 흔적은 그것이 크든 작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시간을 무한히 연장하여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천재들이나 영웅들의 삶만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하고 사소하고 헛되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 진흙 위에 남아있는 지렁이의 흔적처럼 아련한 삶조차도 소중히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닮음과 예수 따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 영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벗어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지고 가야 할 보배입니다! |






| 
|




 전체글등록 : 2,971
전체글등록 : 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