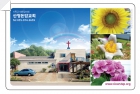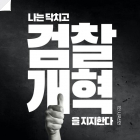|
|

룻기 공부 ⑩ -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다 (룻기 4:1~8)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왜 그를 시형제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덜 가까운 보아스를 택했을까요? 만일 그 아무개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나섰더라면, 또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나오미와 룻과 심지어 보아스 자신마저도 그 아무개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보아스의 수단에 맡겨집니다. 미리 말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선택하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무개에게 단순히 룻을 데려갈 테냐 안 데려갈 테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무개가 결국 룻을 보아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함 보아스가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사다’라는 낱말과 ‘무르다’라는 낱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익명의 친족 의무 수행자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사라고 하면서, 그 말을 다시 반복할 때 무르려면 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는 자기가 무르겠다고 대답합니다(4:4). 이것은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밭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말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그 날로 룻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4:5). 그러니까 그 아무개는 자기는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4:6). 오히려 그는 보아스더러 룻을 사라고 합니다(4:8). 여자를 가운데 놓고 마치 물건 흥정하듯이 두 남자가 무르라느니 사라느니 하니까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두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물건 팔 듯 사거나 무르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룻은 노예가 아닙니다. 보아스나 아무개가 룻을 맡아야 하는 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친족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홀로 사는 아내가 비참하게 되는 일을 막고, 후손이 없이 죽은 그 친족의 이름과 재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무르다와 사다가 함께 쓰일 때의 뜻은, 사실 친족의 의무(혹은 권리)를 수행하다라는 고귀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친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 것은, 룻을 두고 보아스와 아무개 두 사람이 법정 재판을 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지 결코 여자 노예를 첩으로 사듯 그렇게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보기 만일 익명의 아무개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룻을 통해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그 고귀한 일을 마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몰랐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든 아니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룻기 공부 ⑪ - 라헬, 레아, 다말 (룻기 4:9~12) 레아와 라헬 증인들이 한 결혼 축사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할 때면 늘 순서에 마음을 쓰게 되는데, 이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나다 순서나 알파벳 순서는 좋은 해결책인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는 선임자부터 혹은 연장자부터 앞세워 기록하는 방법도 씁니다. 본문에 나오는 결혼 축사는 룻을 라헬과 레아에 비교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버지 라반의 두 딸이기도 합니다. 라헬은 아우이고 레아는 언니입니다. 결혼도 언니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축사를 보니까, 두 아내를 언급할 때 아우를 먼저 언급합니다. 라헬, 레아 순서로. 그렇다면 왜 라헬을 먼저 말했을까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레아보다는 자기들에게 친숙한 라헬을 먼저 언급한 것일까? 혹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 가운데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일까? 또 어떤 주석가들은 레아보다는 라헬이 룻과 닮은 데가 더 많아서, 특히 두 여인이 다같이 오랜 기간 임신하지 못해서 애태우던 경험이 같아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룻과 다말 다말과 룻은 몇 가지 점에서 서로 닮았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또 둘 다 자식 없이 일찍 과부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인이 된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서 새 남편을 찾는 시형제 결혼 제도에 따라 재혼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할 형제가 없어서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의 경우는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고, 룻의 경우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두 여인이 다 자기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관계하여 아이들을 낳습니다. 생각해보기 룻기에서는 죽은 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피할 만하다는 것을 경험한 룻의 안식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






| 
|




 전체글등록 : 3,092
전체글등록 : 3,092